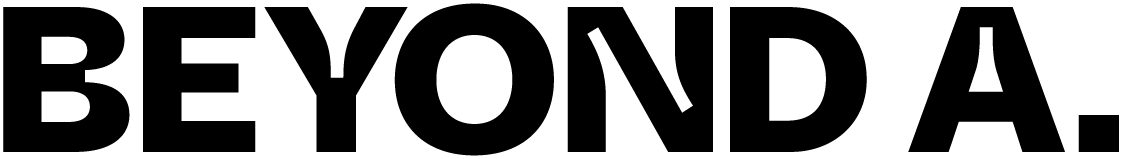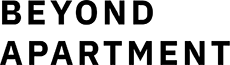편리함을 넘어 돋보이는 가치와 분명한 교감을 요구하는 시대. 아파트 디자인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안정된 기본값에 충실하겠다는 태도만으로는 사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주거’는 늘 예민하고 까다로운 잣대에 오르는 인간의 기본 가치다. 이제는 전에 없던 문제를 발굴하고 독립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차별화된 공간으로서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때다. GS건설 자이가 부대시설 통합 디자인 파트너로 최중호스튜디오와 손을 맞잡은 이유다.
이들은 거주자가 매일 보는 장소이자 기능이 명확한 공용 공간을 디자인 대상으로 삼았다. 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 센터 같은 시설부터 단지 입구, 주동 출입구 같은 파사드 디자인이 리스트에 올랐다. 그간 부대시설 특화 디자인을 수면 위로 끌어낸 시도가 왕왕 있었으나 현장마다 다른 환경에 매번 개별적인 해석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번 통합 디자인은 그 틀을 깨려는 실험으로, 대외적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시도이자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삶을 담는 허브 공간의 역할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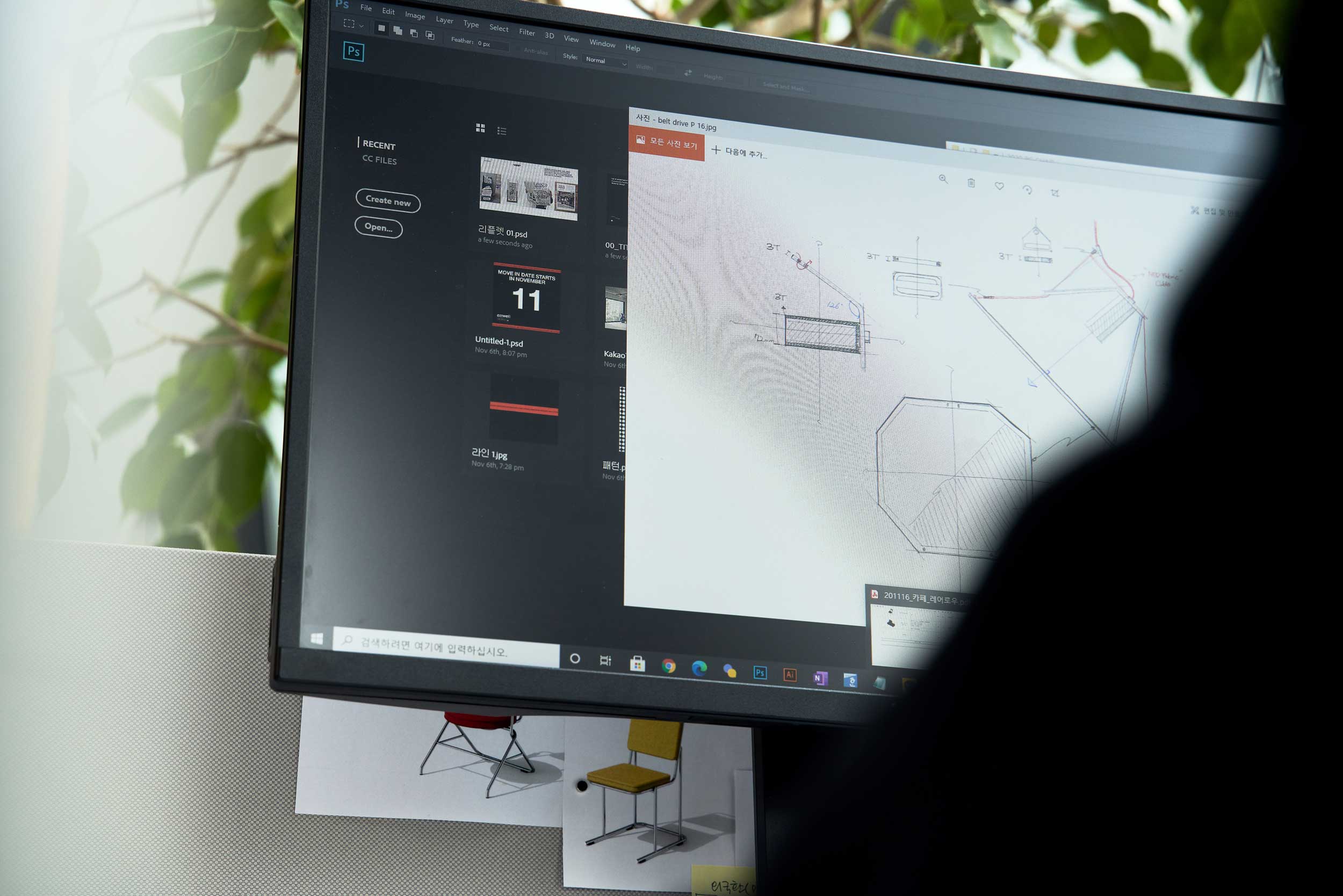
현재 자이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자이 브랜드의 부대시설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면 좋을지 큰 틀에서 맥락을 잡는 중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주자가 부족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개선하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장소별로 다르게 소개했던 부대시설의 톤과 무드를 해결하고 자이만의 솔루션으로 통합해나아가고자 해요. 그래서 이 일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공식이 없었어요. 과업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죠.
어떤 기준으로 통합 디자인 대상을 정했나요?
먼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시로 단지를 돌아다니며 관찰했어요. ‘낮인데도 1층 로비는 어두침침하다’, ‘어린이집 앞에 킥보드가 널려 있다’, ‘성큰 광장의 계단이 어색해 보인다’ 등등. 직관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을 리스트업하면 솔루션이 필요한 대상이 보이거든요. 특히 이번 프로젝트처럼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와 다른 접근이 필요할 때는 사용자 시선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때 너무 기능적으로만 접근하면 건조해지니까 디자이너가 개입해 브랜드의 맥락에 맞춰 공간 비주얼을 재정의하는 일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와 다른 접근이 필요할 때는
사용자 시선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장면을 쪼개고 확대해서 보는 시선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제품 기반의 디자인 스튜디오라서 작은 단위,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사람이 보고 느끼는 요소나 감정에 훨씬 집중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첫 프레젠테이션에서 저희는 거주자 설문 내용을 발표했어요. 많은 거주자가 아파트 주동 색이 무엇인지, 브랜드 로고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인즉슨 본인 시야에서 벗어나는 건 인상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했죠. 한편 사람들이 집 바깥으로 나오는 건 어떤 니즈가 있다는 거거든요. 산책하고 싶다든지, 사색을 즐기고 싶다든지, 혹은 이웃과 만나고 싶다든지. 이런 감정을 더욱더 풍요롭게 느낄 수 있는 배경으로서 부대시설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사용자 중심의 경험을 기반으로 다시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인 거죠.


이전의 부대시설 특화 디자인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이미 여러 아파트가 특화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부대시설은 기능과 감성이 결합된 분위기이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엔 멋진 카페나 좋은 공원, 아름다운 전시장에 가면 사진을 찍어 SNS에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부대시설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시설만 보면 충분히 어필하고 싶은 요소는 맞거든요. 기능적으로는. 그럼에도 사용자에게 어필하지 못했다는 건 감정을 교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부대시설을 배경으로 자신을 담아서 자랑하고 싶을 만큼 멋진 곳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실제로 그런 맥락이 디자인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구체적인 상상을 한 다음 필요한 장치를 만들죠. 아직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 터라 개략만 말씀드리면 실내와 실외, 보행로와 정원, 녹지와 벤치 등 나란히 존재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그 경계를 면밀히 살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좁은 주동 출입구 영역에는 완만하고 넓은 계단참을 두어 내·외부의 완충지대를 만들고, 맥락 없이 단절된 성큰 광장 영역에는 지상부의 녹지와 수경 공간을 연계해 시각적인 흐름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어린이집 가는 길목엔 트랙을 만들어 아이들이 재미난 이벤트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접근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거주 공간을 살필 때 어떤 면을 주로 보나요?
나라는 사람을 잘 담을 수 있는 곳인지, 구조와 형태가 세련된 그릇인지를 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실 그다음 단계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스스로 피드백이 계속 오거든요. ‘나는 창문 옆에서 자는 걸 좋아하는구나’, ‘친구들이 놀러 올 때 테이블을 이렇게 두면 좋겠네’ 이런 피드백요. 그런 걸 잘 캐치해서 능동적으로 공간을 바꿔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스스로 피드백이 계속 오거든요. 이런 걸 잘 캐치해서
능동적으로 공간을 바꿔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구 위치를 자주 바꿔보는 것이 나에게 맞는 공간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방법이겠네요.
제가 봤을 때 아파트에서 가장 큰 문제는 TV와 소파 위치를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 틀을 깨보는 거죠. 이런 부피가 있는 가구는 레이아웃만 바꿔도 공간이 입체적이고 풍부해지는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요즘에는 가전과 가구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팁으로 ‘늘 비슷한 가구 배치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보라고 권해요. 그러면 굉장히 창의적인 공간이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다양한 변화를 포용할 여지를 구조적으로 갖추는 것이 아파트의 중요한 옵션이 되겠네요.
변용이 가능한 구조나 형태를 디자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용자의 취향을 담을 수 있습니다’에서 끝나면 어딘가 부족하죠. 공급자는 기준점과 더불어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콘텐츠로 정리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해요. 사용자가 여러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도 될 수 있어?’ 하는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요. 그 사례는 향후 사용자의 취향과 환경이 변해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맥락을 디자인화하는 거겠죠. 저희 역시도 매 프로젝트에서 디폴트를 만들면서도 다른 시나리오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걸 이미지화하려고 해요.

라이프스타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사실 규정짓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클래식 스타일, 모던 스타일, 빈티지 스타일 같은 거. 라이프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 그러니까 음악, 옷, 신발, 취미, 음식 등을 포괄해서, 또는 뭉뚱그려서 말하는 단어 같은데, 저는 이게 개개인의 다양성을 좁히는 말 같아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라이프스타일이란 단어를 해체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구체화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스스로 단어를 찾거나 만들어가는 시도도 좋겠어요.
공간의 만족도를 높이는 단 하나의 팁을 알려준다면요?
유튜브에 ‘컬러Colors’란 채널이 있어요. 신인부터 거장까지 다양한 아티스트의 공연을 아카이빙하는 채널인데, 특징은 똑같은 스테이지에 색깔만 바뀐다는 점이죠. 아까 TV 위치를 바꿔보라고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데, 이 채널의 컬러 쇼 영상을 틀면 공간의 결이 일시에 바뀌는 것 같아요. 음악도 흘러나오니까 더욱 감각적인 체험으로 다가오죠. 간편하게 공간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을 때 이처럼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Editor | MH Choi
Photography | JM Kim
Film | JY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