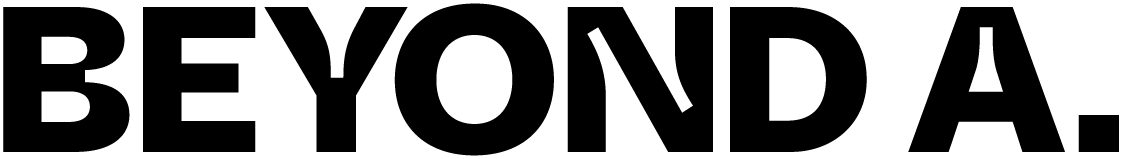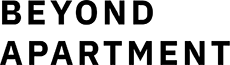급격한 도시화와 기술 발전으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말았다. 디지털 기술은 편리함을 선사하는 대신 오감과 직감을 앗아갔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시 자연을 찾기 시작했다. 실체를 향한 탐닉, 원초적 삶을 향한 동경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다.

테라스 2
자연에서 찾은 조용한 혁명
물론 자연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존재했다. ‘환경주의’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인 1900년대에도 이미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20세기 중반부터 현대 생태주의의 기틀이 잡혔다. 정치학자 로널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의 말을 빌리면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고 있었다. 하지만 자연이 대중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2000년대에 유행한 이른바 웰니스 열풍과 맞물리면서부터다(한국에서는 ‘웰빙’이라는 용어로 유행했다). 사람들은 ‘잘 산다’는 것의 참의미에 대해 돌아보고 ‘느리게 살기’, ‘자연과 어우러지기’ 등의 주제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자연에 가까운 테라스야말로 나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라이프스타일을 가꾸는 데 최적의 공간이 아닐까?
동시대 크리에이터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간파했다. 2016년 1월 프랑스 <메종 & 오브제>의 트렌드 테마가 ‘와일드Wild’였다는 사실 역시 이를 방증한다. 당시 주제관의 기획 및 연출을 맡은 디자이너 프랑수아 베르나르Francois Bernard는 거대한 숲 혹은 태고의 동굴 등을 산책하듯 순환하며 거닐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 이목을 끌었다. 공간 구석구석에 나뭇가지를 설치해 근원에서 오는 안식과 평안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자연을 담는 그릇이 된 집
돌이켜보면 집은 언제나 자연을 곁에 두고자 했다. 작게는 창가의 화분부터, 크게는 아파트 단지의 조경까지. 예술공예운동을 주창했던 윌리엄 모리스가 자연에서 영감받은 식물 패턴 벽지를 제작·생산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자연과 주거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 주거 공간이 자연을 들이는 방식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과감해졌다.

주거 공간에 자연을 들이고자 하는 욕망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을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과 야외 활동이 어려운 현실이 맞물리며 자연스럽게 눈길이 테라스로 향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플랜테리어로 집 안을 꾸미는 일이 흔해졌고, 이른바 ‘식물 집사’를 자처하는 이들 또한 늘어났다. “우리는 개방형 창문, 줄리엣 발코니와 소형 테라스를 흔히 보게 될 것이다.” 시애틀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찰리 헬스턴Charlie Hellstern은 앞으로 10년 후의 주거 트렌드를 묻는 <워싱턴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실내 문화가 종국에는 하늘과 태양, 산들바람 같은 자연을 집 안으로 들이게 만들 것이라는 게 그녀의 주장이다. 이 밖에 수많은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테라스의 중요성을 역설하는데 그중 테라스는 주거 공간에 자연을 들이는 가장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다.
집과 자연의 거리 좁히기
자이는 접지층 테라스인 ‘더 테라스’와 최상층 테라스인 ‘더 로프트’를 비롯해 ‘로지아the Loggia’, ‘듀플렉스 테라스the Duplex Terrace’ 등으로 집과 자연의 거리 좁히기를 실천 중이다. 저층부에 위치한 ‘더 테라스’는 전통적 개념의 테라스다.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접지층 테라스는 그 자체로 문화적 자부심이자 평화로운 일상을 의미한다. 2015년 급진적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연쇄 테러에 맞서 파리 시민들이 벌인 ‘나는 테라스에 있다(Je suis en terrasse)’ 캠페인은 이를 잘 보여준다.
돌이켜보면 집은 언제나 자연을 곁에 두고자 했다.
당시 파리지앵들은 테라스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사진과 함께 “나는 테라스에 있다”라는 문구를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했다. 이는 공포에 굴복하지 않고 평화로운 일상과 문화적 자부심을 지켜내겠다는 일종의 다짐이었다. 바비큐 파티나 테라스 캠핑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더 테라스’ 역시 평화로운 일상을 대변하는 공간이다. 과거 아파트 1층은 조망권과 일조량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리 선호하지 않았으나, 자이는 이 같은 특화 설계로 저층부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최상층 테라스 ‘더 로프트’는 옥상 테라스와 다락방을 갖추고 있어 ‘스테이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다. 일찍이 건축가 르코르뷔지에는 공동주택 위니테 다비타시옹Unité d’Habitation을 설계하며 옥상 정원을 제안했다. 당시 그는 ‘주거’가 현관 밖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현실화한 공간이 바로 옥상 정원이었다.

‘듀플렉스 테라스’는 공용 공간과 연계된 세대별 복층형 테라스를 말한다. 복층 구조를 활용해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워라밸’의 가치를 공간 안에 구현했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부층 테라스를 실내 정원으로 가꿔 지인들과 소셜 다이닝을 즐기고, 상부층은 오롯이 개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한 것이다. 또 듀플렉스 테라스의 탁 트인 천장고는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하기도 한다.
‘로지아’는 펜트하우스 개념을 전 층에 도입한 기준층 야외 테라스로 자이의 건설 기술이 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래 로지아는 한쪽 또는 그 이상의 면이 트여 있는 방이나 복도를 의미하는 유럽의 건축 기술을 뜻한다. 이탈리아 건축양식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형식은 거실 한쪽 면이 정원과 연결되도록 트여 있는 구조를 뜻하기도 한다.
자이의 테라스는 모두 서비스 면적이기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자이의 로지아는 외부로 열린 구조다. 접지층과 최상층뿐 아니라 전 세대에 고층형 테라스를 접목했다는 점에서 자이가 테라스를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접근했는지 알 수 있다. 3평에 이르는 자이의 테라스는 모두 서비스 면적이기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 무엇보다 자연을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다.
일찍이 아르헨티나의 대문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는 “누군가 꽃을 가져다주길 기다리는 대신, 당신 자신의 정원을 가꾸고 당신 자신의 영혼을 장식하라”라고 말했다. 자연에 가까운 테라스야말로 나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라이프스타일을 가꾸는 데 최적의 공간이 아닐까?
Editor | MH Choi
Photography | Morley von Sternberg
Illust | HK Shin